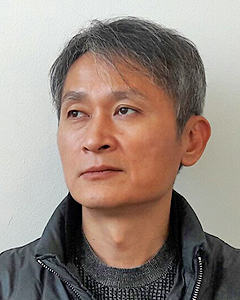
5년간 250여명 해녀 사진 작업
자부심 높고 당당한 모습 담아
해외언론·페스티벌 초청 주목
"제주해녀를 묻는 인터뷰 때 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 자체가 소중한 존재들이라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세계의 인정을 받을 만 합니다"
해녀 작업을 하는 작가군 중에 '김형선'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해외에서 먼저 오르내렸다. 20년 가까이 상업 사진가로 활동해온 그는 운명처럼 해녀를 만났다. 5년 전 우도에서 만난 해녀는 금방 작업을 마치고 뭍에 올라온 참이었다. "순간 아무것도 안보이고 해녀 삼촌만 보였다"고 당시를 떠올린 김 작가는 "해녀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5년에 걸쳐 250여명의 해녀를 사각 프레임에 담았다. 그동안 배운 것도 많다. 가장 큰 성과는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인정과 해녀 특유의 여성성이다.
김 작가는 "4~5시간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해녀들이 힘든 와중에도 얼굴 가득한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신다. 해외에서 주목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개인전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등 해외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올해 프랑스 툴루즈 페스티벌과 포토 드 메르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휴머니즘'과 '페미니즘'이었다. 김 작가는 "'제주해녀를 알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란 얘기가 많았다. 해외에서는 그들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당당한 여전사로 본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권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다. 제주해녀와 해녀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셈"이라고 풀이했다.
김 작가는 "해녀 삼촌들도 지역이나 작업 방식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처럼 해녀문화의 다양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보석"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로 그런 존재감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