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바꾸는 힘, 공공미술] 14.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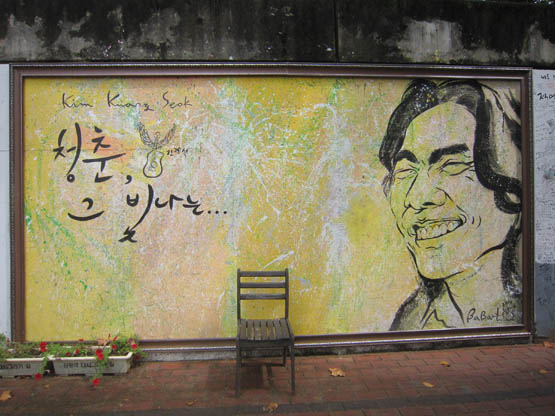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지리,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펼쳐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은 연쇄점과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손수 만든 기념품과 소품을 아트숍에서 판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을 마을활동가로 양성하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남 화순군, 충북 음성군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사업발굴, 이에 걸맞은 추진력이 성공요인이었다.
공공미술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예술이라는 영역이 공공성을 확산시키고자 갤러리 밖으로의 외출이지만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간에서의 예술적 행위인 것이다.
우리 주변엔 전문예술가들이 일시적으로 상주하면서 만들어낸 공공미술작품을 쉽게 접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작업 초창기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방관자로 소외되거나 벽화 한 귀퉁이를 색칠하는데 참여한 것이 고작인 경우가 허다하다.
외부에서 온 작가들이 스쳐지나가듯 작업한 곳이기에 사후관리는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투색되고 벗겨지면서 오히려 흉물로 변했지만 예산도 없다보니 마을에서는 당초 약정한 보존기간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민일보의 지역을 바꾸는 힘 '공공미술' 연재를 통해 살펴 본 성공적인 마을미술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런 고민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지만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충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은 공개되었으며 사업이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은 예술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때로는 원활한 상호 소통을 구축하는데 전체 사업기간의 반 이상을 소비한 현장도 있었다. 기다림에 지치고 이해와 포용에 한계가 있을 법 하지만 일단 소통이 이루어지면 원만하게 추진되었고 지역주민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의 창작활동의 성과물이라기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안고 살아가는 마을주민의 예술활동이며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구쟁이 꼬마 손부터 어르신의 거친 손까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만든 작품들이 마을에 설치되고 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존, 향유, 창조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기나 긴 생명줄을 이어갈 것이며 진정한 가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다시금 깨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