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행복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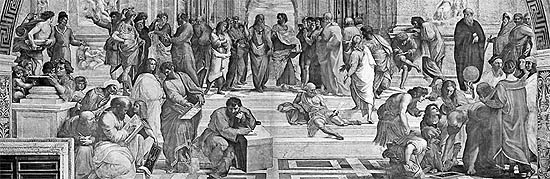
선을 향한 탁월한 행위의 결과가 행복…탁월성은 그 자체로 즐겁고 고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왜 그럴까. 행복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서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물질적 혹은 가시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행복의 순간 혹은 행복하면 생각나는 영상들을 떠올려보자. 어떤 말,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그것은 무엇이며, 왜 행복한가.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2350년 전에 한 철학자가 했다. 그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총 13장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윤리학 서적이라 할 수 있다. '니코마코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공통된 이름이라고 한다. 즉,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주는 윤리학'으로 봐도 좋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행복'이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탁월한 기예를 발휘하여 가장 좋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성에 의해 도달한 최고 선의 상태, 그것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행복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선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장은 "모든 기예(techne)와 탐구(methodos),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좋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는 활동(energeia) 그 자체를 추구하며, 또 어떤 행위는 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과물(ergon)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의 목적이 그 일 자체를 수행하는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을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좋음'들에도 일정의 계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선에도 종류가 있으며,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행위가 최고의 선한 행위이며, 탁월한 행위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좋음' 그 자체를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탁월함'이다. 탁월함은 선이며, 행복이다.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나이 때문에 아직 그러한 일들(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하다고 이야기되는 어린이들은 행복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다.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도 필요하지만 완전한 생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김상진 외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탁월성에 따르는 이성적 영혼의 활동'이라면서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인자는 '탁월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탁월성'은 '잘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 행위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이성(logos)의 기능(ergon)을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잘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탁월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탁월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목표이며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종류를 열거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한다. 흔히 행복한 삶을 말할 때 '향락적 삶', '정치적 삶', '관조적 삶' 등을 나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운데 '향락적 삶'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 삶'은 그 명예를 수여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향락적 삶'과 '정치적 삶'은 인간 이성이 좋음을 향해 발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은 '선을 향한 탁월한 행위'의 결과가 행복이란 것이다. 인간은 모든 기예와 탐구, 행위와 선택에서 어떠한 '좋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좋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잘 행위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잘 행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기예와 탐구, 행위와 선택에서 '탁월성'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이 그 자체로 즐겁고 고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탁월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품성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제로 행위가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 수행이 잘 이뤄지고 있을 때만 탁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은 행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되고 악기를 연주해봐야 악기 연주자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있는 행위를 해야만 절제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용감한 사람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운명이나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에 의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일·우정·공부 등 인간이 날마다 행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행복감은 달라진다.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일, 공부, 우정이 행복의 지름길이며 어떤 목적 즉, 명예나 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의 반복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탁월성'에 이를 수 있다. 좋은 일을, 좋아서 반복하면 탁월해지고, 그것이 행복이니라.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언하는 행복론이다. 제주대 평생교육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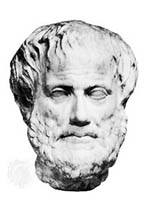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지식 분야는 물리학·화학·생물학·동물학·심리학·정치학·윤리학·논리학·형이상학·역사·문예이론·수사학 등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큰 업적은 형식논리학과 동물학 분야의 연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학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지만, 19세기까지는 관찰과 이론 면에서 그의 연구를 넘어선 사람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