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 주는 남자]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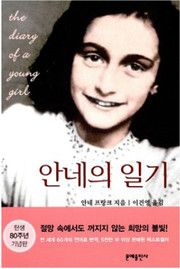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 개인적으로 입는 육체적 상처와 마음의 상처, 세상과 사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간다.
가족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에서 잘못된 만남에 의해서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나서 고통과 슬픔을 겪다가 상처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몇 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라는 질병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남을 육체적 상처를 남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같은 나라였던 종족이 갈라져 처참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본성은 대체 어떤 모습을 지닌 것인가를 새삼 묻게 된다. 파괴된 도시는 다시 복구하면 되겠지만 사람들 가슴에 남은 마음의 상처는 어이 회복될 것인가.
더운 여름날, 새벽이 다 되도록 어수선한 마음을 다스리며 서고에 앉았다. 오래된 책들 중에서 갑자기 「안네의 일기」가 눈에 들어온다. 책을 쓴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는 1929년 6월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 통제를 강화하자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여 은신했다. 그곳에 숨어 지내며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까지 사춘기 소녀의 성장 과정과 삶에 대한 꿋꿋한 용기를 표현한 글이 『안네의 일기』 이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곳은 아우슈비츠의 기록이다.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었던 유대인 수용소의 이름이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텅빈 상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많은 절규와 한숨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공허의 어둠 속에서, 바닥없는 절대 침묵 속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아무것도 답하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질문한다. 아우슈비츠는 어디인가.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안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상처를 입었는가. 언젠가 필자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그곳을 배회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언했다. 그곳에서는 인간도 진실도 생명도 없었다. 오직 짐승과 거짓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어느 철학자는 "아우슈비츠 이후로 서정시는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아우슈비츠 이후 오늘까지도 우리는 짐승같이 거짓을 말하며 죽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안네는 적는다. "두려움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이 순결하다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행복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한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네의 일기」는 어둠의 역사가 만든 깊은 상처의 기록이다. 자유와 진실과 행복을 봉쇄당하고 빼앗긴 인간이 입은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상처가 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 세상에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상처의 기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