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기획 '제주잠녀'6부-제주해녀문화목록 바깥물질4 독도 물질사
반세기 넘은 기억, '어떻게'보다 '왜'의미
사람·민속지식 이동, 관습 재편성 등 영향
199.년대 초반까지 제주여성 생활력 각인
기록 속 '독도 출가 물질'은 1900년대 초까지 거슬러가지만 기억은 1950년대를 지나서야 시작된다. '잠녀.잠녀문화'를 얘기하며 늘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다. 활자로 남아있는 것은 '몇 명이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지독히도 객관적인 내용이지만 가슴에 품은 것들에는 글로는 다 옮길 수 없는 '사연'이 가득하다. 역사는 지나간 일들의 조합이다. 역사가가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그 해석이 달라진다. 후대인들이 단순히 문헌을 통해 오래된 과거의 사건과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거를 살필 때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발적'출가 기억 온전

그나마 해녀박물관의 현지 조사와 제민일보 잠녀기획팀의 취재 등을 통해 통사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있다.
살아있는 잠녀들의 기억을 조합해보면 '자발적'인 독도 물질은 1953년을 전후해 시작됐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독도에 상륙하자 울릉도에 거주하는 민간인들과 울릉도 출신 국방경비대를 주축으로 독도의병대가 조직돼 독도 지킴이(1952~1956)를 자청했고 그들을 도왔던 이들 중에 '잠녀'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잠녀들의 기억은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다.
'돈 벌 수 있다'불편 감수
지역 신문의 독도 관련 기사 등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1953년 최초로 박옥랑·고정순 등 4명과 1954년 김순하·강정랑 등 6명이 독도에서 물질을 했다. 이후 1955년 홍춘화·김정연 등 30여명이 독도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기사 내용은 당시 독도 물질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실제 1956년 이후에는 한해에 많게는 30~40명의 잠녀가 독도에 입도해 물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기억'이라는 것이 벌써 50년을 훌쩍 넘었다는 사실이다. 1953년 독도 물질을 했다는 박옥랑 할머니가 꼭꼭 묻어뒀던 기억을 꺼낸 것은 그로부터 무려 56년이 지난 2009년이었다. 독도 바다를 헤집을 당시 19살이었던 비바리는 어느새 칠순을 훨씬 넘긴 나이가 됐고, 그로부터 다시 5년여가 지났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1959년 독도행 발동선에 몸을 실었던 김공자 할머니도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제주에 비해서는 물건이 풍부했고, 울릉도에 비해서는 바다밭 텃세가 덜했던 터라 독도에 가기 위해 뇌물까지 썼던 때였다. 그렇게 고생을 하며 찾은 독도에서의 생활은 다시 기억하기 싫을 만큼 고단하고 힘들었다.
일부는 집을 떠나 멀리 까지 나가 물질을 하는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자신의 기억을 억지로 묻은 경우도 있었다.
잠녀문화의 전파 모델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통이 있어 빨래며 목욕까지 해도 물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사정이 나아졌지만 1970년대 양식 미역의 등장은 제주잠녀들의 울릉도.독도 행을 막았다. 그랬다고 멈춘 것도 아니었다. 1973년부터 1991년까지 18년 동안 독도 바다를 헤집었던 고순자 할머니의 기억은 앞서 독도 물질을 했던 잠녀들과는 다르지만 그 역시 역사다. 선착장 공사를 위한 모래를 나르고, 머구리 작업에 투입되는 등 '나잠업'이라는 기본형과는 차이가 있지만 바다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잠녀'는 반세기 넘게 독도와 하나였고, 지금도 그 연(緣)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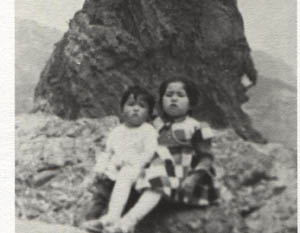
지난 2009년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에서는 '제주 잠녀'를 언급한데 그쳤지만 2011년 「독도주민생활사」에는 제주잠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탰고 나아가 '제주잠녀가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지키면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도주민생활사」에는 1950년대 독도에서 미역작업을 하던 제주 해녀들이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의 활동을 도왔던 사실과 이후 1970~80년대까지 독도를 생업의 영역으로 하여 독도에 사람이 발붙일 터전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잠녀인 어머니를 따라 독도까지 갔던 아이들의 사진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독도에 남았던 제주 잠녀 고순자 할머니가 1984년과 1987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두 차례나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연도 찾았다.
제주 잠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간 유형도 세 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첫 번째는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경우이다. 당시 독도에서 조업을 한 잠녀들은 일본인을 통해서 모집된 사람들로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들어가 조업활동을 했다. 그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전량 일본으로 보내졌다.
두 번째는 광복 후 1950년대 이후 독도로 들어간 잠녀들로 이들의 독도 행에는 전문적인 모집원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바깥물질하러 나왔다가 울릉도로 들어간 잠녀들 중 결혼 등의 이유로 그 곳에 터를 잡은 잠녀들이다. 이들은 주로 울릉도에만 머물며 울릉도 주변 근해에서만 작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