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의 제주도 19. 감자<2>

화전민과 서민에게는 식량
선교사가 알려준 감자재배법
1인당 감자 소비량 약 70kg
△우리나라에 온 감자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시기는 19세기이며, 중국과 서양을 통해 들어왔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기록처럼, "감자는 북저(北藷)라고 한다. 일명 토감저(土甘藷)이다.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것은 순조 24년(1824)에서 순조 25년 사이. 관북(關北) 지방의 북계(北界)에서 처음 전해진 것이다. 또한 함경도 명천부(明川府)의 김모(金謀)라는 관상쟁이가 경사(京師:북경)에 가서 가져왔거나, 산삼을 캐러 몰래 국경을 넘어 함경도로 들어왔던 청나라 사람이 산골짜기에 감자를 심어서 먹었는데, 그들이 떠난 자리에 감자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잎은 무청과 같고, 뿌리는 토란과 같았다. 무슨 식물인지 몰라 옮겨서 우리나라 땅에 심으니 드문드문 자랐다. 시장에서 청나라 상인에게 물어보니 북방감저(北方甘藷)라고 해서 좋은 식량이 된다"라고 했다(「五洲衍文長箋散稿」).
또, 다른 감자의 기원설로, 순조 32년(1832) 조성묵이 지은 「원저방(圓藷方)」에는 "우리나라에 감자가 처음 들어온 것은 북개시(北開市)의 영고탑(寧古塔)으로부터이며, 북감저(北甘藷)라고 부르는데 본래 중국의 서남쪽이 원산지이나 거기서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전파되었다가, 마침내 동쪽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감자는 남방에서 전해져 북방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자가 서양에서 전래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1862년 김창한(金昌漢)이 지은 「원저보(圓藷譜)」에는 "북방으로부터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7~8년이 지난 순조 32년(1832)에 영국의 상선 로드 애머스트(Lord Amherst) 호가 전라북도 해안에 약 1개월간 머물고 있었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마크 브란덴부르크 출신 개신교 선교사 칼 프리드리히 어거스트 귀즐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1803~1851, 중국명:郭實獵)가 김창한의 아버지에게 씨감자를 주면서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그 감자를 재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귀즐라프의 눈에는 조선의 땅이 중국보다 훨씬 기름져 보였지만 경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이상했다. 당시 애머스트 호에서 씨감자를 내린 사람은 귀즐라프와 허이 해밀턴 린세이(Huyh Hamilton Lindsay)였다. 이들은 씨감자를 배에서 내려 육지에 올라 모여든 주민들 앞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1백 종 이상의 감자를 심어 주었다. 귀즐라프는 종이에 미리 적어온 감자 재배법을 땅 주인(김창한의 아버지)에게 주었고, 그에게서 감자를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튿날 감자 심은 곳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준 귀즐라프는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다. 영국 상선 애머스트 호에는 모두 67명이 타고 있었는데 귀즐라프를 비롯하여, 선장은 리즈(Rees), 또 영국 동인도회사 답사반장이자 중국 광동 주재 수석 화물 관리인 허이 해밀턴 린세이 등이었다. 애머스트호는 1832년 7월 중국 산동 해안을 시찰한 후 조선에 왔다. 이 배에 타고 있던 린세이는 영국 모직물의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귀즐라프는 통상 이외에 개신교 복음 전파라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다(박천홍.2008).
감자는 점점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혹독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화전민이나 서민에게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소앙(素昻) 조용은(趙鏞殷, 1887~1958)의 「소앙집(素昻集)」에서 1927년도 마령서(馬鈴薯:감자)의 생산량은 1억1815만8675관이고 가격은 1843만4494원이었다.
일제강점기 1930년에 우리나라 감자 재배 면적은 1.91㎢였으며, 화전이 많은 함경남도가 전체 감자 면적 46%를 차지하고 있었고, 1832년 귀즐라프가 가져온 구근식물로서 한국 재래종 감자는 기후에 좀 더 잘 적응하는 외국산 품종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재배 면적이 52%가 여전히 재래종 감자가 차지하고 있었다(헤르만 라흐텐자흐,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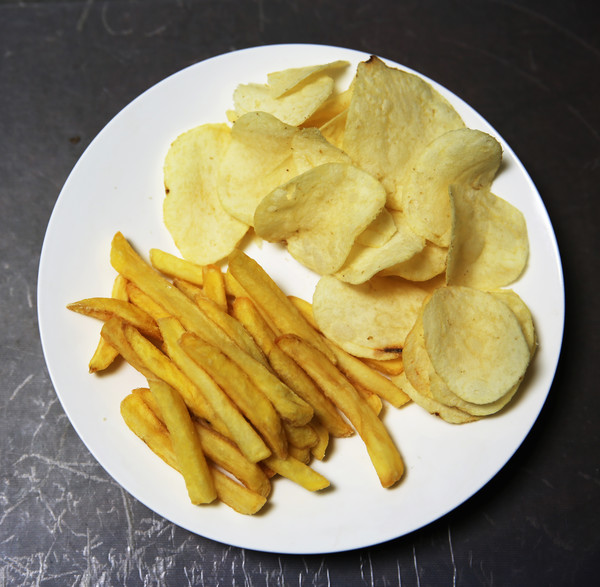
△제주도의 감자
감자는 지실(地實), 또는 지슬이라고 한다. 문헌에는 북감저(北甘藷)라고 기록돼 있다. 제주도에서 감저(甘藷)는 고구마를 말한다. 제주도의 감자는 19세기말 20세기초 육지에서 들어왔다. 1905년 대표적인 일본 식민지 경영을 위해 편찬한「조선의 보고(寶庫) 제주도안내」제10편 상업 부문에 "감자 1백근:6백문부터 8백근까지"라고 하여 씨감자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자는 목포나 부산의 개항장으로부터 일본 도기(陶器)와 광목 등 일본식 잡화에 끼어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12년 제주도에서 전혀 재배가 안 되는 작물의 종류에 감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돌피, 기장, 옥수수, 귀리, 재래 면화(棉花), 모시, 닥나무, 완초(莞草:왕골), 사과, 배, 포도 등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케 했다. 1930년이 되면 극히 적게 생산되는 작물로 감자와 함께, 벼, 쌀보리, 밀, 육지 면화, 백채(白菜:배추), 첨과(참외), 견(繭:누에고치)이 있었다. 1931년에도 변화없이 약간 재배되는 것으로 감자, 돌피, 수수, 팥, 녹두, 완두, 들께가 있었다.
그러나 1937년 말에는 제주도 전역에 감자를 심고 있었다. 감자 우량종은 제주읍(64/단위는 町反), 한림읍(47), 대정면(9), 안덕면(56), 중문면(66), 서귀면(13), 표선면(12), 조천면(148)로 총계(415)이며, 전년도(340)에 비해 75정반이 늘어났다. 또 재래종을 재배하고 있는 곳은 애월면(72/町反), 한림면(186), 안덕면(74), 구좌면(130), 조천면 149)이며, 총계는 611정반으로 전년도(497)보다, 14정반이 늘어났다.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는 30~40년 전부터(1900년대초) 감자가 있었는데 아주 적게 섬으로 건너온 역사는 서귀포 서홍리에 살았던 프랑스 선교사가 40년 전에 제주도로 전래했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감자 재배 농가
1939년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는 아라리 굴지(屈地)에 있는 농가를 찾아가 조사를 했다. 이 농가는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농부는 안창섭(50세)이었는데 부인(38세)과 함께 3남 1녀가 사는데 이 부부는 10년 전 아들(2세) 한 명을 데리고, 전주(全州)에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아라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는 물질밭 5말지기(1말지기 1백 20평)를 1년에 소작료로 3원을 내면서 '감자 그루에 무 1백 평, 메밀 5백 평'이라는 재배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지주는 제주 성내의 프랑스 신부였다. 이 밭의 감자 수확은 최고 15가마니에서 최저 8가마니로, 평균 10가마니가 생산됐다. 감자 종자는 1가마니(5말 내외)가 들었다.
또 그는 읍내 삼도리에 사는 지주로부터 오롬밭도 빌렸는데 4정 거리(1町:109.1m)에 있는 5말지기(6백평) 밭을 연 3원을 주고 소작했다. 감자는 1년 걸러서 봄 감자와 여름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다. 오롬밭의 감자의 수확은 보통 5말들이 5가마니였다. 올레밭에서는(평수 미상) 감자가 10가마니가 생산되었으며, 세밭에서는 수확한 감자가 12가마니였다. 농부 안씨의 연간 예상 감자 수확량은 2백 말 정도였다. 농부 안 씨 가족이 사는 집은 천주교 소유로, 대지 50평에 3칸짜리 가옥 2동이며, 주변에 천주교 소유의 소나무밭이 있다.
우리나라의 감자는 북쪽 지방에서는 식량으로, 남쪽 지방에서는 채소 작물로 취급되었다. 감자 생산량은 1960년 306ha에 2,422M/T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1105㏊에 17,671M/T으로 증가했다(제주도, 2006). 현재 감자는 전 세계 130여 국에서 재배되며, 연간 약 3억1000만t 정도 생산되고, 전 세계 1인당 감자 소비량은 약 70㎏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