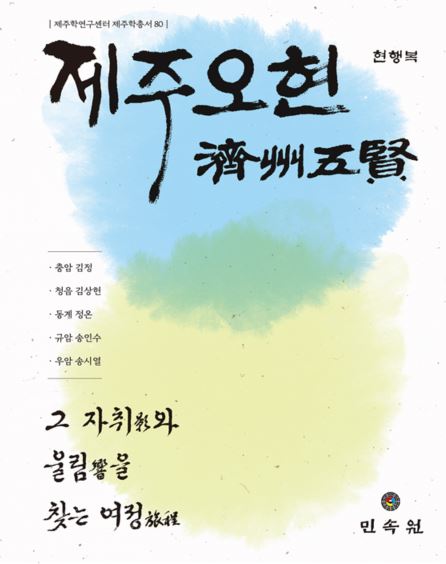역사·민속·사회·자연 분야 아우르며 제주학 연구 지평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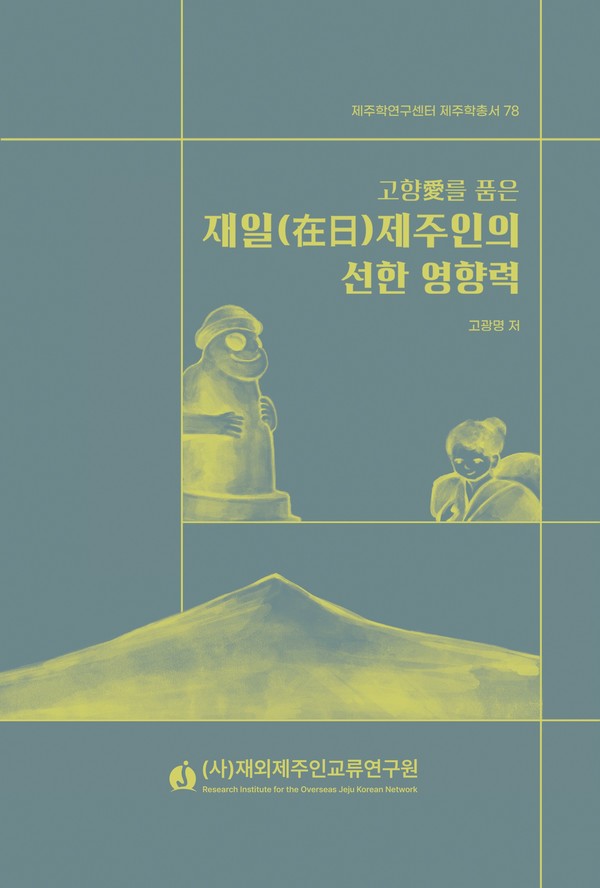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가 2025년 연구비 지원 공모를 통해 수행된 출판물과 연구보고서, 기획주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4일 올해 이뤄진 연구가 제주사의 정체성과 민속문화, 지역사회 변화,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제주학 연구의 범위를 한층 확장시켰다고 밝혔다.
출판물 분야에서는 재일 제주인의 기증·교육·문화 활동을 정리한 고광명 연구자의 '고향愛를 품은 재일(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이 눈에 띈다. 디아스포라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일우 연구자의 '오늘의 제주, 역사로 묻고 답하다'는 탐라·귤·말·제주 여성 등 제주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역사를 재구성해 문답 형식으로 풀어냈다. 현행복 연구자의 '제주 오현, 그 자취와 울림을 찾는 여정'은 충암 김정을 비롯한 오현의 사상과 유적지를 답사하며 조선 지성사 속 제주를 재조명했다.
연구보고서 자유주제와 기획주제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강대훈 연구자의 '2010년대 제주이주의 전개와 지역사회 변화'는 청년 중심의 문화이주에서 자산·문화자본 기반 이주로 흐름이 이동한 과정을 분석하며 공동체와 이주민 사이의 사회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좌혜경 연구자의 '제주 돌하르방과 석장승의 비교민속학적 연구'는 돌하르방의 기능·형태를 육지 석장승과 비교해 제주 고유 문화유산의 보존 방향을 제안했다.
김수지 연구자의 '죽음사회성과 죽음물질성이 매개되는 장으로서의 제주 4·3 위령 의식'은 위령제가 지역사회와 디아스포라를 잇는 기억의 장임을 규명했다. 최돈원 연구자의 '기후조건에 따라 비석에 나타나는 생물침해와 처리방안 연구'는 향교·목관아 일대 비석의 손상 현황을 조사해 실질적 보존관리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기획주제에서는 한창훈 연구진이 수행한 '요나구니의 제주 표류민 기억 전승과 문헌 기록의 대비 연구'가 주목된다. 1477년 제주 표류민 사건을 성종실록과 요나구니 섬 주민 구술 자료로 비교해 전승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사건의 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올해 연구는 제주학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지역 연구자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제주학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출판물과 연구보고서는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