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 선도하는 제주] 2. 송성욱 교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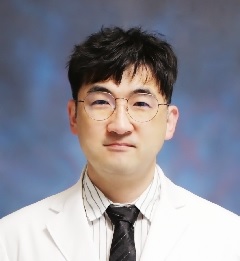
2004년 도입 당시 분류 한계…이후 지표 개발 2019년 고도화
전체 환자 표본 수집 강점…다만 소방·병원 통합 시스템 구축
실제 효과 분석 강조도…"도민주도형 확대 지속 가능성 확보"
제주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당시 호평이 이어졌던 '제주형 손상감시체계'를 통한 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정책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성욱 제주도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제주형 손상감시체계'는 예방 정책 수립 시 과거의 분류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후 체계를 세분화해 2019년 고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형 손상감시체계'는 2004년 도입 이후 2017년 기존 문제점을 파악해 손상감시 조사항목 개정 및 제주지역사회 맞춤형 통계지표를 개발했고 2019년 GIS 기반 안전 지리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면서 개선된 것이다.
현재 지역 내 6개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해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45개 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한 120개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시기별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전사고 주의보'도 발령하고 있다.
송성욱 위원은 "해당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과 함께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손상 환자의 전수 표본을 수집 및 연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다만 현재 병원과 119구급대가 별도 자료를 관리하면서 일부 중복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주 안전 도시 사업은 안전 전문기관인 소방이 추진하면서 사고와 손상 예방 정책에 실질적 참여 및 위험 요인 제거 등 개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반면 지역사회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다루는데다 강제성이나 권한이 없어 비효율적인 약점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도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라면서 "제주 안전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도민 요구 안전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주도형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